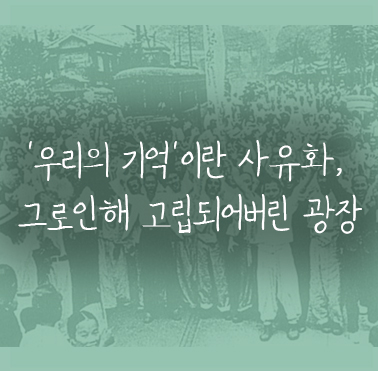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방식에 대해 : 폐쇄적 가족주의를 넘어 다시 광장으로
- 성석환(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교회의 ‘3.1운동 100주년(이하 100주년)’에 대한 기념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 기념세미나, 기념예배, 기념대회들이 벌써 지나간 사건이 되고 있다. 이는 유독 숫자와 이벤트에 집착하는 한국교회의 도착적 기념방식에 기인한다. ‘평양대부흥 100주년’도 그러했고, 그 중요했던 ‘종교개혁 500주년’도 그렇게 과거가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는 무수히 많은 사건을 기념하지만 때로 형식이 그 의미를 배반하고, 기억하지만 때로 퇴행적이거나 추억에 매몰되고 만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화될 수 있을 때, ‘100주년’과 같은 계기는 오늘의 의미로 재해석할 기회를 허용한다. 만약 그 기억의 방식이 오늘의 의미로 다가올 수 없다면, 또 그 현재적 의미의 역사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100주년’이든 ‘500주년’이든 그 기념은 이기적이거나 무의미한 행사로 전락한다. 그 화려한 수사와 미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100주년’을 기념, 기억하는 우리의 태도와 형식은 일정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광장에서 배제된
정부와 서울시 및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100주년’ 행사들도 전에 없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광장에서 펼쳐졌다. 건국과 정부수립 시점에 대한 역사논쟁과 구한말과 유사한 현재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놓고 볼 때, 정부로서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1운동이 100년 전 광장에서 배재된 조선 백성들이 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와 그들의 주장을 외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100주년’ 행사가 광장에서 이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자랑스러운 신앙적 유산으로 고백하면서도 ‘종교개혁 500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100주년’의 실천적 의미를 기독교 공동체 외부로 확장하지 못한 채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일에 실패한 듯 보인다. 심지어 보수단체의 극우적 행사가 유일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다보니, 기독교가 고백하는 ‘100주년’의 신학적 의미가 광장에서 유통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사회와 광장에서 배제된다.
이런 사정은 주류 기독교를 비판하는 진보적 복음주의권이나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공적이며 사회적인 사건을 기념하면서도 기독교계는 그 기념을 내부화한다. 광장의 문법과 존재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니, 광장을 점유하면서도 광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기독교적으로 기념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신들이 광장에서 고립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100주년’을 기억하는 신학적, 신앙적 도전들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예배와 학술대회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도 하겠으나, 이 도전들의 역사적 정당성이 분명하다면 그 도전은 한국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비전이며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개혁의 의제이든 자긍심을 살리려는 의도이든, 우리는 100년 전 광장에서 발발한 사건의 의미를 철저히 우리의 기억으로만 ‘가족화’하고 ‘집단사유화’하여 광장으로부터 스스로 배제되는 형식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런 자기만족적 형식은 그 신학적 해석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회의 기억이 “3.1운동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오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한국교회의 진상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또 민족주의와 결합된 신앙 이데올로기는 국수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기독교신앙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이기적 가족주의의 한 형태이며,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장의 소통을 어지럽히거나 혹은 광장으로부터 소외를 자처하는 기독교계의 기념방식은 이처럼 이기적 가족주의를 신앙과 결합시킬 때 발생한다. “우리가 중심이었다.”는 기억만이 ‘100주년’을 지배하면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화려할 수는 있으나, 공적 영향력이 발휘되는 사회적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한국교회의 ‘100주년’ 기념이 광장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
오늘의 기독교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을 극복해야 하는 신학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광장의 기독교라는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탐색하는 이들이 많다. 이 여정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 중심주의’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렸던 것처럼, 100년 전의 광장의 사건이었던 ‘3.1운동’의 100주년을 ‘우리만’의 기억으로 독점하여 ‘우리끼리의’ 기념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광장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마을의 광장으로 달려 나가 외쳤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은둔자가 아니고 사회적 삶의 한 가운데로 나왔다. 십자가 형틀이 무서워 떨던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다시 예루살렘의 광장에서 외쳤다. 주님은 대적자들의 서슬 퍼런 눈이 꽂히는 광장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다. 그는 종교적 형식에 갇히지 않으시고 인생들과 삶을 함께 하셨다.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 경계선을 넘어 사회적이며 공적인 삶의 자리를 회복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억에서 기인한 실천이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마지막 만찬의 명령은 단지 기독교적 의례이거나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으로 교조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부활 사건을 독점하지 말고 동시대 사건으로 증언하라는 선교적 명령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사건들의 기억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광장의 사건, ‘3.1운동’을 오늘의 ‘사건’이 되도록 하려면, 그 ‘기억’이 협소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국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극우적 보수주의와 결탁하여 배타적 국가주의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기념단상을 점거한 남성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여성과 청년들에게 정당한 자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0년 ‘3.1운동 101주년’ 기념은 광장에서 한국교회의 청년들과 여성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검은 양복을 입은 권위자들은 주위로 물러서고, 광장에 어울리는 옷차림과 노랫가락으로, 시민사회가 갈망하는 바로 그 ‘3.1운동의 정신’에 기독교가 가장 진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노라 다짐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광장의 일원으로 공공의 기억에 참여하여 그리 빛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먼저 희생하라.”는 그 사회적 요구에 ‘3.1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선조의 모범을 이어받아 그리 하겠노라 선언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너와 나를 가르고 위와 아래를 가르는 한국사회의 무수한 경계선을 끊임없이 지우며, 인간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광장을 채웠으면 좋겠다.
'사건과 신학 1기 > 3.1운동 100주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9 시대유감 / 남기평 (0) | 2019.03.26 |
|---|---|
| 삼일운동과 예수운동,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한수현 (0) | 2019.03.26 |
| ‘밀운불우’(密雲不雨)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나며 / 송진순 (0) | 2019.03.26 |
| 3.1운동 100주년, 우리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 김한나 (0) | 2019.03.26 |
| 3.1운동 100주년과 목소리 없는 사람들 / 박흥순 (0) | 2019.03.26 |



